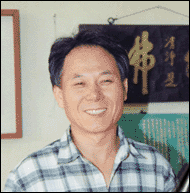 깍을수록 매력 있는 작업 - 서각
깍을수록 매력 있는 작업 - 서각
나무 만진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다. 개념도 없이 나무로 이것저것 깎아보던 때까지 합치면 어린시절부터 그의 곁엔 늘 나무가 함께 있었다.
"남들이 이름에 '각'자가 있어서 운명적으로 서각을 하게 된 게 아니냐고 묻지요. 지금의 저를 보면 아마도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취미 삼아 시작한 서각이 어느덧 업이 돼 버린 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늘 행복하다는 그의 나무냄새 나는 작업실을 찾았다.
서각의 매력에 취해 벌써 서각을 한 지 20년이 됐다. 20년 전 각자장 보유자인 철재 오옥진 선생을 만나면서 김각한씨와 서각의 질긴 인연이 시작됐다.
벌써 서각을 한 지 20년이 됐다. 20년 전 각자장 보유자인 철재 오옥진 선생을 만나면서 김각한씨와 서각의 질긴 인연이 시작됐다.
스승을 만나기 이전부터 취미삼아 목공예를 해왔지만 서각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게 된 것은 오옥진 선생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85년 고미서각연구실(현 고미서각원)을 개원하면서 그의 서각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고미서각원은 타 작업실과 달리 전시관과 교육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작업실로 서각을 배우기 위해 드나드는 사람만도 10여명 내외다.
대부분 서각은 유명 서예가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서각 때문에 서예도 익혀 자신의 글을 조각하기도 한다.
국산재로 표현하는"서각의 미" 오랜 기간 서각을 해온 그는 서각을 하기에 좋은 나무를 꼽으라는 말에 서슴없이 우리나무만한 것이 없다고 답한다.
오랜 기간 서각을 해온 그는 서각을 하기에 좋은 나무를 꼽으라는 말에 서슴없이 우리나무만한 것이 없다고 답한다.
홍송, 느티나무, 은행나무, 돌배나무, 살구나무, 참죽나무, 산벚나무……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 국산재만큼 서각을 돋보이게 하는 나무도 없단다. 개인적으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좋지만 좀을 먹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은행나무도 좋은 재료다. 불상을 만드는 데 은행나무가 많이 쓰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대형 작품을 제작할 때는 국산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국산재가 소경목이어서 대형작품은 수입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국내 최초 후불 서각 선보여 중곡동 기원정사에는 김씨에게 가장 인상깊은 작품이 모셔져 있다. 보통 불상 뒤에는 탱화라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기원정사에는 후불서각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87년 제작된 후불 서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있는 작품이다. 작품크기도 370㎝×270㎝에 달한다.
중곡동 기원정사에는 김씨에게 가장 인상깊은 작품이 모셔져 있다. 보통 불상 뒤에는 탱화라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기원정사에는 후불서각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87년 제작된 후불 서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있는 작품이다. 작품크기도 370㎝×270㎝에 달한다.
"이따금 작품이 잘 있는지 보려고 기원정사에 가곤 합니다. 워낙 큰 작품이고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돌봐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천년을 가는 목재문화재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문화재수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서각이나 단청 등의 문화재 보수도 자주 한다.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문화재수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서각이나 단청 등의 문화재 보수도 자주 한다.
문화재를 보수할 때마다 그는 보수해야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문화재들이 아쉽기만 하다. 특히 서각은 원형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보수가 가능한 데 이 시기를 놓쳐 버릴까 조바심이 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시멘트 건물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목조건물은 몇 천년을 갑니다. 제 때 보수를 해주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죠"혹시 지금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도 몇 세기 후 누군가에 의해 보수작업이 이뤄질 지 또 모르는 일이다.
문화재 보수시 처음 작품이 제작된 나무와 같은 나무를 구하기가 가장 어렵다. 단청처럼 색을 칠한 작품의 복원 시 원형과 보존 후의 모습이 미미한 차이로 전문위원들과 예기치 않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단청은 오랜기간동안 계속 재 채색을 하는데 색을 벗기면 더 오래된 이전 문양이 나온다. 문양을 벗겨낸 후 나오는 문양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점하나 위치와 크기까지 따지고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서각 흉내만 내서는 곤란
